캄브리아기 이전의 생명은 단조로웠다. 눈도 없고, 팔다리도 없고, 내장도 없고, 혈관도 없고, 뼈도 없었다….
캄브리아기 이전의 생명은 단조로웠다. 눈도 없고, 팔다리도 없고, 내장도 없고, 혈관도 없고, 뼈도 없었다. 생명이라기보다는 젤리 같거나, 해파리 비슷하거나, 바닥에 붙어 있는 납작한 조각들에 가까웠다. 움직임은 거의 없었고, 보는 것도 먹는 것도 느끼는 것도 전부 수동적이었다. 이 고요한 세계를 뒤흔든 것이 약 5억 4천만 년 전 시작된 ‘캄브리아기 대폭발(Cambrian Explosion)’이다. 짧게는 2천만 년, 길게 잡아도 3천만 년 남짓한 시간 동안, 지구에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생명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다. 눈을 가진 생물이 등장했고, 팔다리를 휘둘러 헤엄치고 기어다녔으며, 입과 항문을 통해 먹고 배설하고, 소화기관이 생기고, 혈관과 심장이 생기며 산소를 온몸에 전달하기 시작했다. 외골격과 내골격이 발달하면서 몸을 보호하고 구조화하는 기능도 처음 등장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생명은 처음으로 본격적인 감각기관, 이동수단, 소화 및 순환기관 등 생명체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갖추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눈을 갖는다는 건 처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고, 팔다리가 생겼다는 건 처음으로 스스로 길을 만들고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이며, 내장과 순환계가 생겼다는 건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생명이 갖추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캄브리아기 이후, 진화는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는다. 삼엽충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아노말로카리스가 최초의 포식자로 군림하며, 오파비니아는 다섯 개의 눈을 달고 세상을 관찰했고, 할루시게니아는 다리가 위인지 아래인지조차 알 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 생존을 시도했다. 생명이 단순한 구조물에서 벗어나 복잡한 기계이자 주체로 변모한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생명체가 복잡해졌다는 것을 넘어서, 생명이 비로소 세상을 감각하고, 그 감각을 바탕으로 반응하고, 그 반응을 통해 생존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캄브리아기 이전의 생명은 단순했다. 그 단순함이 평화로웠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 이후의 혼란과 경쟁, 그리고 다채로움 위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뇌 역시 그 짧은 폭발 속에서 처음으로 설계도가 그려졌는지도 모른다. 진화는 언제나 점진적이지만, 어떤 순간에는 방향을 꺾고, 속도를 높이고, 폭발하듯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캄브리아기 이후 지구를 통해 우주는 스스로를 알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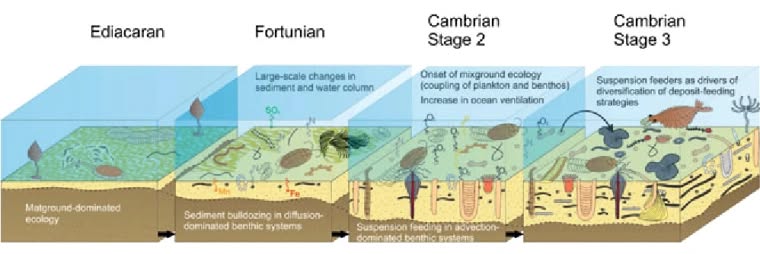

Leave a Reply